코스믹 유머
『시오리와 시미코』, 모로호시 다이지로

0. 시오리와 시미코
시오리와 시미코는 명랑하다. 이건 『시오리와 시미코』라는 만화책이 명랑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만화책의 두 주인공인 ‘시오리’와 ‘시미코’가 명랑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오리와 시미코』는 호러 장르임에도, (아주 정확한 방식으로) 빗나간 호러를 계속해서 선보인다.
토막 난 시체의 머리를 ‘굉장한 발견’이라고 생각해 아이스박스에 넣어오는 시오리나, 아이스박스에서 뭐가 나오든 놀라지 말라는 시오리의 말에 따라 놀라지 않는 시미코나, 둘 다 명랑하기는 마찬가지다. 심지어 이들은 시미코네 집이 운영하는 헌책방에 있는 “잘린 머리 (올바른) 사육법”을 읽고, 시체 머리에 먹이를 주다가 뒤늦게서야 약간의 징그러움을 감지하고 강가에 방류하기도 한다. 이웃집 친절한 부인이 말 그대로 ‘집’만 한 얼굴을 지닌 까닭을 묻는 시미코에게 시오리는 ‘외국인이셔서’라는 짧은 대답으로 갈음하고, 그런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자고 한다. 기괴하고 호러적인 사건들도 시오리와 시미코의 명랑함 앞에서는 ‘사소한’ 일이 되고 만다. 도대체 시오리와 시미코의 명랑함은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왜 이들은 자살을 원하는 딱한 친구의 사정을 듣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다시 말해 그 친구의 ‘자살’을 돕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자살관’을 찾아주면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일까?
1. 코스믹 호러, 또는 코스믹 유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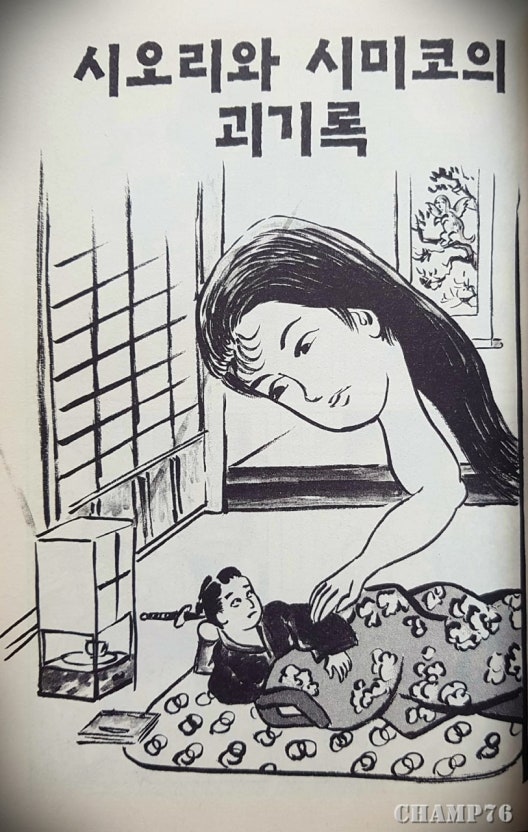
“내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다행인 일은 인간의 정신이 그 속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다. 끝없는 암흑의 바다 한복판, 우리는 그중에서도 무지라는 평온한 외딴섬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만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멀리 항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제각각이었던 지식이 통합됨으로써 현실의 끔찍한 전망과 더불어 그 속에 자리한 우리의 소름 끼치는 처지가 드러날 것이다. 아마 우리는 그 드러남에 미쳐버리거나, 그 치명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새로운 암흑시대의 평화와 안정 속으로 도망쳐 들어갈 것이다.”
- H.P. 러브크래프트 『크툴루의 부름』 중
이쯤에서 우리는 『시오리와 시미코』의 장르라 할 수 있는 코스믹 호러, 다른 말로 러브크래프트적 호러 장르의 관습을 지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크툴루 신화’는 우주의 고대 신들과 인간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초월적이고 거대한 존재들로 구성된 세계관이다. ‘코스믹 호러’는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함과 인간이 결코 이해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미지의 것들, 즉 크툴루 세계관에서 비롯된 공포를 다루는 장르다. 마땅한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그것’은 알 수조차 없기에 대항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무기력은 ‘크툴루 신화’의 장르적 특질이기도 하다. 『시오리와 시미코』에서는 이러한 크툴루 세계관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앞서 언급한 ‘집’만 한 얼굴을 보유한 이웃집 아줌마와 그 이웃집 아줌마의 딸, 그리고 반려동물인 ‘요그’는 그림을 보고도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하기 힘든 괴생명체를 장난감으로 다루다가 먹는다. 이 장면에서 그들은 전형적인 크툴루 신화 속 존재처럼 보인다.
러브크래프트의 예측대로라면, 시오리와 시미코는 ‘미쳐버리거나’, ‘평화와 안정 속으로 도망쳐’야 한다. 그러나 『시오리와 시미코』는 크툴루 신화 세계를 ‘별거 아닌 일’로 관습화하고, 자신들의 세계로 기꺼이 수용한다. 이는 코스믹 호러의 장르적 관습을 배반하는 일인 동시에, 그러한 배반이 가능한 호러 장르에 속한 만화만이 선보일 수 있는 유머라는 점에서 특권적이다. 호러 장르의 전형적인 문법, 가령 누군가의 조언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다가 죽거나 기절해 버리는 답답한 조연들, 귀신의 소행처럼 보였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유가족이 배후로 밝혀지는 등등의 클리셰는 『시오리와 시미코』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시오리와 시미코』에 나오는 괴물, 유령, 귀신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경우도 존재하긴 하지만) 결코 사람으로 밝혀지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시오리와 시미코도, 여고생들로 대변되기보다 시오리와 시미코 자신으로 존재한다. ‘어딘가 나사 하나’가 빠진 듯해 보이는 시오리와 시미코는 ‘헌책방’에서 들고 온 책들의 조언대로 괴물과 술래잡기를 하거나, 유령을 잡거나, 귀신과 대화할 뿐이다.
2. 이노아타마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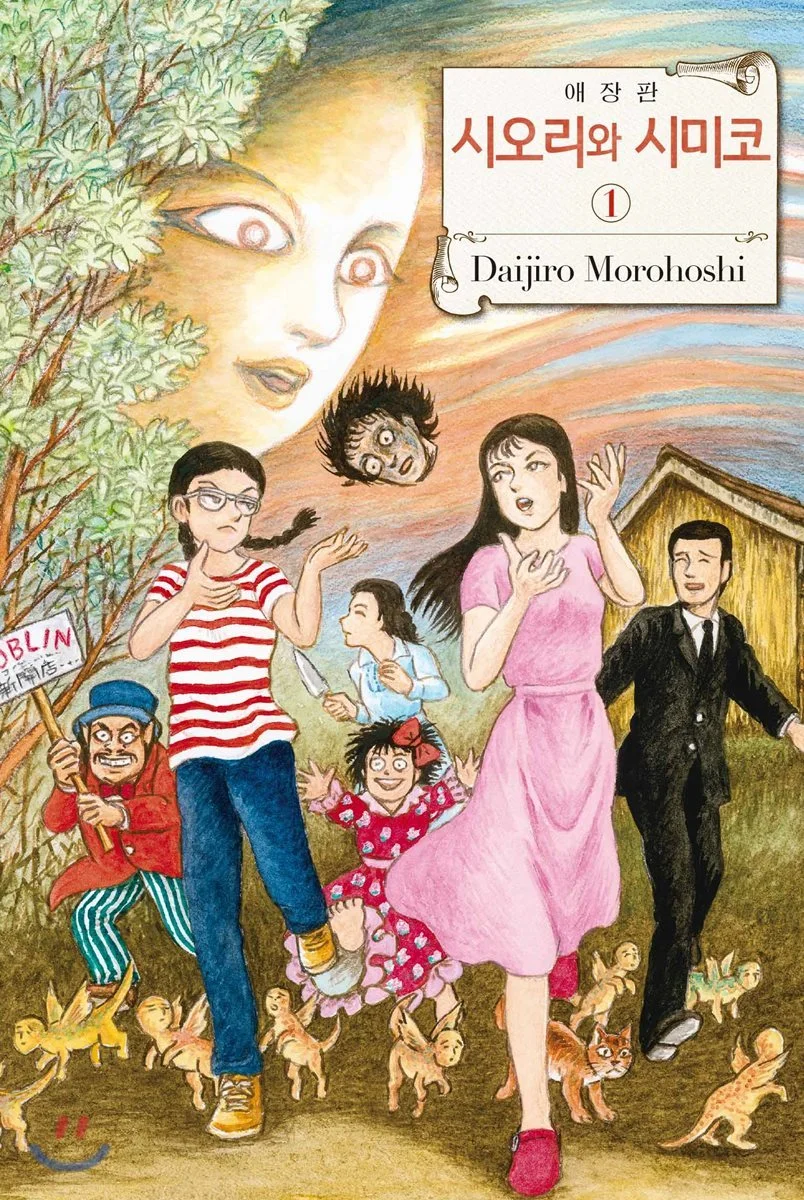
『시오리와 시미코』의 배경인 ‘이노아타마’ 마을에는 오르는 도중에 뒤돌아서는 안 되는 일종의 오르페우스 언덕이 있다. 언덕 아래에는 유령이 운영하는 케이크집이 있고, 그 옆집에는 이상한 괴물들이 산다. 즉 『시오리와 시미코』의 괴기함은 에피소드별로 초점이 달라지지만, 그 초점을 시오리와 시미코가 거주하는 ‘마을’에 둔다면, 괴기함은 통합적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통합적 인식 아래에서도 러브크래프트의 말처럼 시오리와 시미코의 ‘소름 끼치는 처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 하나’가 빠져 있는 이들의 모습만 드러난다. 시오리와 시미코가 자신도 모르게 마을의 괴기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모습은 이들의 처지를 부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대범한 모습만을 드러낸다.
이러한 시오리와 시미코의 모습이 이성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압도적인 무력감을 느끼는 (대문자) ‘남성’과는 대척점을 형성한다는 것은 나의 지나친 해석일까? 그러니까, 괴기한 존재들과 이성적 해명이 불가능한 귀신들, (만화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일종의 ‘그림자’들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을 비이성적인 믿음 또는 세계관을 통해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여성’적인 방식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 그대로 자신에게서 도망가 버린 ‘그림자’를 되찾는 과정을 그린 『시오리와 시미코』의 한 에피소드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그림자’가 ‘타인’에 대한 완벽한 은유로 작동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림자에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잠자리채를 들어 그들과 즐거운 사냥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정신분석적 방식, 그러니까 ‘철 지난 문화비평’이거나, 만화의 서사에서 난데없이 비약하는 해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오리와 시미코』가 호러 장르의 관습에서 의도적으로 빗나갔듯이, 비약을 의도한 독해 또한 비평적 관습을 탈피할지도 모른다. 또는 그러길 바라는 나의 소망에 불과하거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