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OST는 어떻게 세계 시장을 파고 들었나? (上)
서브컬처, 콘텐츠의 중심이 되다
서브컬처는 대중문화와 구분되는 하위문화, 부분문화 또는 저항문화 등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다양한 문화 요소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집단, 특히 일본 문화의 개방으로 형성된 팬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하위문화는 다수가 공유하는 전체 문화 속에서 독특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의 문화를 뜻한다.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와 소셜미디어의 대중화로 다수가 누리는 유행을 따르지 않고도 자신만의 취향을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 환경이 조성되면서 주류문화와 하위문화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졌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미 서브컬처 중심의 콘텐츠와 세계관을 기반으로 게임을 제작하는 것이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서브컬처는 이제 전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MZ세대의 일상적 문화코드로 자리 잡고 있다. K-pop과 J-pop이 교류를 하고, 버추얼 아이돌이 기존 아이돌과 대등하게 인기를 얻는 현상들이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서브컬처는 특정 코드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신나게 즐기는 공간이자 콘텐츠이다. 다양한 서브컬처가 공존하면서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콘텐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 코드를 가진 집단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견제하며 동시에 시너지를 발휘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서브컬처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대중문화와 끊임없이 상호작용 하며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우리 대중문화에서 그간 주목하지 않았거나, 주류 미디어 환경에서 흔히 접할 수 없었던 서브컬처의 속성이 대안을 찾는 대중의 지지를 통해 콘텐츠 시장의 중심부로 떠오르고 있다.
웹툰, 노래가 되다
평면의 텍스트였던 웹툰에 소리가 입혀진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다. 초창기 웹툰의 소리는 효과음이나 기존 음악을 재생하는 BGM 수준이었다. 2011년 출시된 호랑 작가의 공포웹툰 ‘봉천동 귀신’은 웹툰에 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꼽힌다. 고개를 돌리거나 귀신이 달려오는 장면에서 기이한 소리가 나오면서 독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식이었다. 이후 ‘치즈 인 더 트랩’은 전문 연기자들의 목소리 연기와 배경음악이 어우러진 애니메이션 ‘보이스 웹툰’을 선보였고, 기안84의 ‘패션왕’에서는 존재감이 없던 주인공이 패션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일렉트로닉 음악을 재생시키며 장면이 주는 쾌감을 극대화시켰다. 본격적인 웹툰 OST의 시초는 호랑 작가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네이버웹툰에 연재했던 ‘구름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구름의 노래’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다섯 명의 음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클라우드’라는 밴드를 결성하고 생방송 오디션에 출연한 뒤 단번에 스타덤에 오르면서 벌어지는 옴니버스 성장 스토리다. 음악 밴드가 주요 서사인만큼 노래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였고, 그룹 ‘응플라워’가 웹툰에 맞춰 곡을 만든 뒤 2010년 네이버웹툰 ‘구름의 노래’ OST가 정식 앨범으로 발매되었다.

△ 웹툰 ‘구름의 노래’ OST 앨범 (출처: 벅스뮤직)
2010년대에는 웹툰 작가의 인맥을 통해 홍대 인디 가수들이 음원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엔 다르다. 음원 시장에서 웹툰은 작품 감상에 몰입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던 BGM을 넘어 캐릭터의 감정과 서사의 흐름을 표현하는 테마곡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작품의 분위기와 캐릭터의 서사를 3~4분 길이의 노래로 풀어내는 OST는 기존 팬들을 위한 선물이자 새로운 팬을 유입하는 매개가 된다. ‘보는 콘텐츠’에서 ‘듣는 콘텐츠’로의 확장은 웹툰의 장르와 감성을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제공한다. 가창력을 인정받은 가수들의 명품 보컬이 웹툰의 예술성과 창의성은 물론이고 음악 산업과의 매개 효과도 강화시키면서 콘텐츠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협업의 지평을 열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콘텐츠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업이 커지면서 웹툰 OST도 콘텐츠 상품의 한 축이 되었다. 카카오웹툰 ‘취향저격 그녀’의 OST는 웹툰 OST의 장르화를 시도했다고 평가 받는다. 2020년 발매된 공식 웹툰 OST에 유명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취향저격 그녀’는 풋풋한 캠퍼스 로맨스물로, 주인공 해닮의 성장 스토리가 팬들에게 큰 공감을 얻으면서 누적 조회수 2.2억 뷰를 기록했다. 특히 B1A4 산들이 참여한 첫 번째 음원 ‘취기를 빌려’는 음원 스트리밍 차트에서 장기간 2위에 오르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노래 가사 중에서 “언제부턴가 불쑥 내 습관이 돼버린 너…괜히 어색할까 혼자 애만 태우다 끝끝내 망설여왔던 순간”이라는 내용은 가까운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 뒤늦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남녀 주인공들의 마음을 잘 대변한다. 이 노래는 2015년 인디 가수 이민혁이 발표한 곡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이외에도 그레이의 ‘STAY THE NIGHT’(feat. DeVita), 규현의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카더가든의 ‘밤새’, 크러쉬의 ‘Sweet Love’, 몬스타엑스 셔누와 민혁의 ‘HAVE A GOODNIGHT’이 차례로 발매되었고, OST가 특정 회차에 삽입되며 독자들의 몰입감을 높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카카오 웹툰 ‘취향저격 그녀’의 OST ‘취기를 빌려’ 이미지 (출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툰 OST의 강점은 웹툰과 음원이 결합하여 IP 시너지를 낸다는 점이다. 웹툰을 보고 OST 듣고, OST 듣고 나서 웹툰을 보는 식으로 웹툰과 음원 유저가 상호 작용하면서 원천 IP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유명 가수가 OST를 부를 경우 팬들이 웹툰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크다. 웹툰의 OST는 드라마, 영화처럼 캐릭터들의 감정선을 잘 살리면서 독자를 서사 속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한다.
리디의 대표작 ‘상수리나무 아래’는 2021년 첫 OST를 발매했는데 아스트로의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남자주인공 ‘리프탄’의 테마곡을 불러 화제가 됐다. ‘상수리나무 아래’는 마음 속 상처가 깊은 공작가의 장녀 맥시밀리언과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천민 출신 기사 리프탄의 사랑을 애절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탄탄한 세계관과 세밀한 감정 묘사가 어우러져 2017년 발표 직후부터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차은우가 부른 ‘Don’t Cry, My Love’는 맥시밀리언을 향한 리프탄의 헌신적인 사랑이 담긴 가사에 차은우의 부드러운 미성이 더해져 따뜻한 분위기를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첫 앨범에 이어 글로벌 OST ‘Nobody else’가 발매되었는데 여자주인공 맥시밀리언이 남자주인공 리프탄을 향한 사랑과 희망을 담은 R&B 소울곡이다. ‘Nobody else’는 글로벌 웹툰 팬들을 겨냥해 영어 버전으로 제작됐으며, 가수 에일리가 직접 작사와 가창에 참여하면서 화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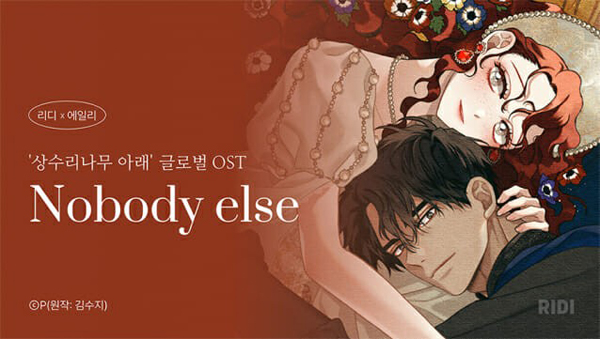
△ ‘상수리나무 아래’ 글로벌 OST 이미지 (출처: 리디)
에일리가 참여한 ‘Nobody else’의 뮤직비디오는 누적 조회수 300만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카카오페이지가 2020년 1월 공개한 웹툰 ‘달빛조각사’의 OST ‘내가 많이 사랑해요’는 가수 이승철이 참여했다. ‘달빛조각사’는 가상현실 게임 속 주인공이 달빛을 조각하는 ‘달빛조각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카카오페이지의 대표 IP다. 누적 조회수 3억 7000만 건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동명의 판타지 웹소설이 원작이다. 소설로 시작한 ‘달빛조각사’ IP는 웹툰, 음원에 이어 뮤직비디오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콘텐츠로 가치사슬을 확장해갔다. ‘달빛조각사’ 뮤직비디오에는 배우 박보검과 당시 떠오르는 신예였던 고윤정이 출연해서 달빛이 깃든 목걸이를 만들어 마음을 전하는 애틋한 첫사랑을 재현했다. 이처럼 성공한 OST는 뮤직비디오로도 출시되면서 연결성과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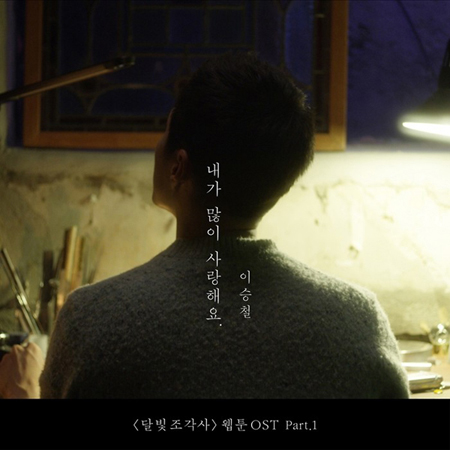
△ ‘달빛조각사’ OST 이미지 (출처: 카카오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