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에게 찍혔을 때>-일진의 유혹, 나쁜 남자 판타지
보통 일진에게 찍혔다면 피칠갑을 한 얼굴부터 떠오르기 마련인데 홍조 띈 미소로 설렘 가득하니 그 모습이 한없이 낯설다.
모바일 게임사 Day7의 <일진에게 찍혔을 때>는 한국 미연시 시장의 기념비로 OSMU의 교보재답게 게임, 웹소설, 웹툰, 웹드라마등 다양한 변주를 보였다. 이야기는 주인공 김연두가 스토커를 떨치기 위해 모르는 남자사진을 프로필로 올리면서 시작한다. 하필 그 남자사진은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일진’ 지현호였고, 가짜 남친 행세는 지현호 귀에 들어가 평범한 김연두와 일진 지현호가 얽히게 된다. 이곳에도 일진이 있다해 찾아온 작품의 이야기는 왜 하필 ‘일진’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왜 일진에게 찍혔는데 기쁜 일이 가득할까? 그간 일진에게 찍힌 인물(찐따, 셔틀 등)들은 피로 얼룩진 폭행과 동성 성희롱, 인격모독을 서슴없이 당했는데 외려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진다. ‘일진과 셔틀’이라 부르는 침탈적 관계가 ‘일진과 꼬북이’라는 표현으로 설정되어있지만 일진이 꼬북이에게 ‘호감을 갖고’ 주종(?)관계를 형성한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다.
작중 일진은 급우를 괴롭히지 않는다. 다만 교실 구석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업을 듣는 것으로 그들의 권력적 위치를 묘사할 뿐이다. 다시 곱씹어보면 일진이 수업을 듣는다는 것부터 기존의 일진과는 다르다. 보통 일진의 활동무대는 교사가 없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고 방과 후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부재하거나(<외모지상주의>, <싸움독학>, <인생존망>) 무능력하고(<프리드로우>) 혹은 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일진의 크기>) 유형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작품 속 교사는 일진을 위협하는 유일한 존재로, 공부 잘하는 주인공은 교사에게 혼나는 일진을 구해주고 이를 계기로 둘 사이는 가까워진다. 교사의 권한이 커졌기에 학생의 비행 수준도 약하다. 음주, 흡연은 찾아보기 힘들며 폭행은 학교 간의 싸움일 뿐 약자를 구타하지 않는다. 학교 서열 정점이자 자본가 위치에서 약자를 다방면으로 수탈하는 남성향 작품의 일진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처럼 일진의 역할기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는데도 작품은 굳이 ‘일진’에게 찍혔다고 표현한다. 왜 그럴까? 작품은 학교의 학생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 평범한 학생, 범생이, 찌질이 그리고 일진. 일진은 학원이라는 세계관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계급이다. 그들은 교사에게 대들 수 있는 위치이며 수업도 땡땡이 칠 수 있는 치외법권이다. 이들의 권능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것으로 인식된다. “알고 있다. 우린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걸. 지현호는 잘나가는 애들 중 하나고, 나는 그냥 평범하고 재미없는 범생이니까.”라는 대사처럼 일진이라는 위세는 신분을 건너뛴 사랑이란 클리셰를 표현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즉 어떻게 감히 평범한 학생주제에 일진과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가라는 판타지를 말이다.
오글거리면서 본다는 시대착오적인 반응은 자연스레 2000년대 초반 ‘귀여니 인소’를 떠올리게 한다. 어른들이 “애기야, 가자”라며 국산차 끄는 재벌과의 연애를 훔쳐볼 때, 학생들 역시 왕자와의 정략결혼, 재벌 후계자들과의 연애, 세계적인 배우와의 동거 등의 소재가 등장했다. 그 사이에 귀여니 작가의 소설에서는 남자들이 앞선 존재들에 비해 평범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기껏해야 학교에서 잘나가는 양아치로 그들은 상식이 부족하고 감정 표현과 제어에 미숙한 모습(츤데레)을 보인다. 거기에 아픈 가족사(특히 아버지)는 필수였다. 그럼에도 싸움을 잘하고 일탈행위를 죄책감 없이 하는 대범함을 지닌 학생, 선생이 쉽게 건들지 못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귀여니 작가가 그리는 남자 주인공은 사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자는 아니지만 일탈이 가능한 존재로 학원이라는 범주 안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삐뚤어지게 된 원인은 가정사에 있으며 주인공은 유일하게 남자의 아픔을 보듬어준다.

신데렐라 컴플렉스와 모성애를 동시에 자극하는 효과로, 남자 주인공의 사회에 입성하면서 동시에 남자 주인공을 길들이는 과정을 보여준다. ‘류설’이라는 라이벌의 질투는 신분상승 과정의 시련이 된다. 예쁜 외모와 날씬한 몸매를 가진 라이벌은 그만한 능력을 가졌기에 그 계급에 서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주인공은 오직 남자 주인공의 간택으로 입성할 수 있다. 라이벌의 입장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나 아닌 다른 여자를 택했다는 것보다 나보다 못한 애를 택했다는 점이 더 화가 나는 것이다. 주인공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장벽을 깰 수 있는 것은 남자 주인공과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주인공이 상처받은 남자 주인공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과정이다.
지현호는 일진이지만 일진이길 거부한다. 담임이 그를 일진이라 부를 때 화를 냈고 싸움을 강권하는 선배에게 오히려 애처럼 굴지 말라고 반했다. 싸우고 난 후에는 김연두에게 싸운 모습을 감추고 싶어 했다. 그는 “나는 성격이 좀 나쁜 놈일 뿐이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진 같은 거 아니야.”1)
라는 말로 일진을 부정하고 김연두 역시 그를 일진이 아니라 이해한다. <프리드로우>와 비교하면 평범하지만 공부 잘하는 이민지는 일진 한태성의 세계를 이해하고 작중 웹툰인 <세상에는 착한 일진도 있고 나쁜 일진도 있어>의 스토리 작가로서 일진 세계에 가담한다. <싸움독학>도 폭력으로 얼룩진 유호빈의 생활에 보미, 여루미, 가을이는 적극적으로 조력자 역할을 한다. <인생존망>도 선도부장인 나진솔이 폭력으로 점철된 주인공의 질서를 지지하는 성격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연두는 지현호와 서점에서 문제집을 사고 그의 교과서에 필기를 하는 등 그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일진 세계와 거리두기를 한다.
1) 37화
여성향 작품인 <일진에게 찍혔을 때>를 통해 볼 때 여성에게 일진은 타인을 착취해 서열 정점에 오른 존재가 아닌, 태생부터 서열 정점에 올랐으며 그 권력으로 그저 학교라는 시스템 속에 일탈을 버젓이 할 수 있는 판타지적 존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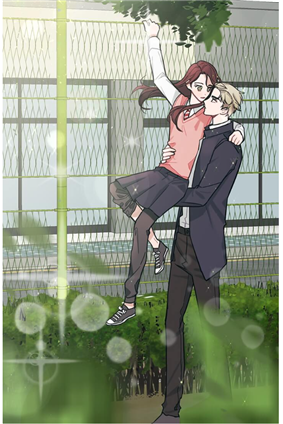
담당일진제를 생각해본다면 일진은 찐따(혹은 셔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둘은 안티테제이다. 그럼에도 <일진에게 찍혔을 때>는 찐따가 등장하지 않는다. 김연두는 스스로를 평범한 학생으로 인지한다. 지현호의 일진놀이는 김연두가 꼬북이가 되면서 시작하지만 일진인 그가 이전에 셔틀이 없을 리가 만무하다. 의도적 배제는 지현호가 ‘사실은 일진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한다. ‘잘생긴’ 나쁜 남자 판타지인 것이다. 판타지는 일진이라는 맹수 같은 존재를 길들여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독점과 소유의 욕구를 실현시킨다.(본 작이 원래 역하렘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독점욕과 소유욕은 당연하다.) 일진이지만 이는 아픈 가정사 때문에 드러나는 방어기제인 것이라 모성본능을 자극한다. 제멋대로에 반항적인 태도는 알파로서의 카리스마가 되고 일진이기에 할 법한 성희롱은 나쁜 남자와의 심장 터지는 로맨스가 된다.
이런 해석은 이전 <프리드로우>에서 다룬 왜 여성 독자들이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내용에 열광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남성 독자들은 ‘일진-찐따’라는 착취구조를 전복시키거나 혹은 그 구조의 포식자로서 입성하고자하는 양가적 판타지를 갖고, 이를 ‘착한’ 일진을 통해 실현시킨다. 여성 독자들은 나쁜 일진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착한’ 일진에게 나쁜 남자 판타지를 찾는다. 나쁜 남자로서 착한 일진 한태성은 지현호와 모든 것이 등치된다. 오히려 여성들에게 더 나쁜 존재는 일진이 아니라 류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여우같은 여자이다.
다시 질문하자. 왜 하필 일진에게 찍혔다고 했을까. 일진은 나쁜 남자 판타지에 어울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찐따라는 최하위 계급이 아닌 주인공이 속한 평범한 학생과 일진의 만남에서 둘은 직접적인 착취 관계가 아니다. (김연두가 또 다른 일진이자 서브 남자 주인공인 서주호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일진이라서가 아니라 자기에 상처를 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다.) 때문에 평범한 학생은 일진이라는 계급을 선망할 수 있다. 일진이라는 신분과 함께 하는 일탈행위는 시대착오적인 오글거림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학교라는 일상에서 상상해볼 법한 이야기인 것이다. 물론 이 모든 해석의 전제는 잘생겨야만 가능하다. <외모지상주의>의 이진성부터 <프리드로우>의 한태성까지 이들이 착한 일진이자 아픔 있는 나쁜 남자일 수 있는 대전제는 외모에 있다.
일진의 폭력적인 속성을 거세하고 혹은 그마저도 가정사로 발현되는 방어기제로 포장함으로써 일진은 나쁜 남자가 된다. 여성향 작품에서 살펴본 이런 특징은 어떻게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학원 폭력 장르를 수용하는지 해석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일진이라도 내 편이니까, 그의 권력이 오롯이 나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니까. 비록 여전히 나쁜 놈과 나쁜 남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